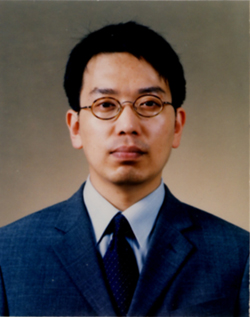
독일유학 시절 종종 ‘유로스포츠’라는 채널을 시청했는데, 그때 거의 매일 볼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스모경기였다. 스모가 ATP 투어만큼자주 방송된다는 건 유럽인들이 이 이국적인 스포츠에 꽤나 흥미를 가져서일 것이다. 한국인인 내게 민족적 질투심이 일어난 것은 당연지사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왜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저 채널에서 한국씨름은 전혀 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라이벌 국가의 국제적 위상 차이가 커서 그럴 것이라는 당연한 답변 외에 우리가 자칫 간과했던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나름대로 찾은 원인은 아주 단순한 데 있었다. 일단 스모는 일본적인 냄새를 풍긴다. 선수의 복식이나 표정, 경기 전후에 행하는 제의행위 등 모든 면에서 ‘메이드 인 저팬’ 냄새가 난다. 이미 바로크와 초기 낭만주의 시대부터 다르고 신기한 것을 동경해온 서구인들의 호기심과 취미에 들어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의 민속씨름에서 풍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냄새는 극히 미약하다. 국적불명의 무슨 응원단장 같은 복장의 심판, 소속기업의 상호를 새긴 빨강, 노랑, 파랑 팬티에다, ‘장사’ 타이틀 딴 이가 ‘승리의 V자’를 그리고 텀블링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머리를 황금빛으로 염색한 꺽다리 선수는 흐느적 허리춤을 추어댄다.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불리던 그가 한 격투기 시합에서 녹아웃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민속씨름은 줄곧 스모에 KO패 당해왔다. 한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외국인은 ‘씨름’ 하면 응당 김홍도의 그림에서 풍기는 극히 한국적인 분위기를 기대한다. 고유의 것이 그토록 철저히 절멸된, 저질 연예프로 같은 것으로 저들의 관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헛된 과욕이다. 윤이상, 임권택, 백남준이 내놓은, 서구인들이 동경하고 예찬하는 우리 문화콘텐츠는 한국적인 향취를 마음껏 발산한다. 쇠락의 징후를 보이는 한류가 모색해야 할 새로운 돌파구도 어쩌면 이러한 평범한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