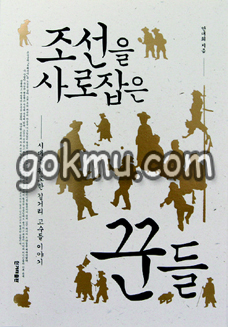
한문학자로 전문적 연구와 대중적 소통 양 방면에 성가(聲價)를 올리고 있는 안대회 교수의 신간이 나왔다. 한국한문학은 학회가 창립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40년이 다 되어간다. 연구 초기부터 조선후기 자료에 대한 발굴 및 연구 편중이 강하였음에도 여전히 발굴을 기다리는 자료가 산적(山積)해 있음을 본서는 거듭 느끼게 해준다.
본서는 조선후기 기인(奇人)이자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여행가, 바둑기사, 화가, 조각가, 무용가, 책장수, 원예가, 천민 시인, 음악가, 과학기술자) 10명의 삶을 다뤘던 저자의 전작 ‘조선의 프로페셔널’(휴머니스트, 2007)과 자매편적 성격을 갖는 책이다. 차이가 있다면 다룬 인물이 훨씬 많아졌고, 그 인물들의 계층은 보다 서민층이란 점, 아울러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인기인들이라는 점이다. 전체를 4부로 나누어 1부는 유랑예인, 2부는 18세기에 큰 화제를 뿌렸던 여성들, 3부는 18세기 한양(漢陽)이란 도시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 4부는 도회지의 어둠과 환락가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다뤘다. 조선후기 유명한 중인(中人) 문인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기이(秋齋紀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관련 신자료를 풍성히 덧보태고 있다.
1973~78년 이우성·임형택 교수의 ‘이조한문단편집(상·중·하)’(일조각)이 나오면서 학계 및 고급 독자대중에 엄청난 반향이 있었다. ‘한문학’하면 봉건 왕조를 대변하는 지배층의 보수적인 문학유산이란 생각이 지배하던 시기에 첨예한 사회 문제들을 담지한 민중적 생동감이 약동하는 ‘한문서사(傳 및 야담)’ 작품들을 발굴함으로써 한문학에 대해 대중 일반이 가졌던 예의 편향된 이미지를 단번에 불식시킬 만큼 반향이 컸던 것이다. 한문학의 이런 우량의 서사 재료들은 이미 홍명희의 ‘임꺽정’을 비롯하여 많은 문학 매체들에 활용되었던 바이나 ‘이조한문단편집’으로 거듭난 재료들은 이후 한국문화컨텐츠로 다양한 기여를 했다. ‘조선 여형사 다모(茶母)’, ‘왕의 남자’ 등으로부터 최근의 ‘추노(推奴)’에 이르기까지 이들 대중영상물의 자료 바탕은 한문학 작품에 있었던 것이다. 2000년을 전후해서 한문학의 대중적 저술들은 인문학 분야 서적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줄곧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조한문단편집’을 읽었던 독자들이 조선후기 사회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책을 읽었다면, 안대회 교수의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을 포함해 요즘의 한문학 대중서를 읽는 독자들은 ‘문화컨텐츠로의 활용’이라는 독서의 목적성을 한 가지가 더 보태고 있다. 책을 읽는 각각의 목적이 어떻든 우리의 ‘전통 서사’들이 독자 대중의 심금을 파고들어, 일본의 미야쟈키 하야오 감독처럼 자국의 전통 서사를 많이 작품화하길, 또 구로자와 아끼라의 ‘7인의 사무라이’를 보면서 ‘사기’·’항우본기’를 떠올리고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를 보면서 명나라 귀유광(歸有光)의 ‘항척헌기(項脊軒記)’나 조선 심노숭(沈魯崇)의 ‘신산종수기(新山種樹記)’를 떠올릴 수 있는, 뇌리 속에서 시·공간을 무한 질주할 수 있는 고급 독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